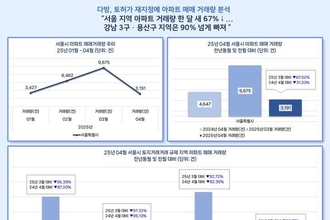극단 프랑코포니의 신작 연극 '무대게임'은 몰리에르 프랑스어권 최고극작가상(2003)을 수상한 극작가 빅토르 아임의 대표작이다.
여배우와 연출가를 연기하는 두 명의 배우가 등장하는 2인 단막극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작가이자 연출가인 '제르트뤼드'와 재기를 꿈꾸는 여배우 '오르탕스'가 공연 연습을 위해 극장의 빈 무대에서 만나 하루동안 벌이는 일을 담았다.
두 사람의 설전은 작가와 연출가가 지니는 두려움 외에도 표현의 자유, 검열, 기자와 평론가들의 권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시대를 풍자한다. 각자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가면을 벗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실체를 까발린다.
연출을 맡은 한국외국어대 카티 라팽 교수는 "연극에 대한 연극인데, 결국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흥미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등·퇴장이 없는 단만극이라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배우들에게 큰 체험이 된다. 굉장힌 에너지가 필요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애 마음에 들었다. "파워의 문제를 다룬다. 극장 밖에 있는 독재의 문제도 이야기 한다. 무대에서는 연출가의 독재가 있다. 한국에서 연출가의 파워는 세다. 그래서 흥미로운 작품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제34회 서울연극제 연기상과 제6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인기상을 수상한 김시영이 오르탕스를 연기한다. 배우뿐 아니라 연출, 번역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임선희가 제르트뤼드를 연기한다.
임선희는 연출가를 연기하면서 한국 연출가의 힘을 느꼈을까. "(사람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남들을 다루면 미묘한 쾌감이 있는데, (연출 역이) 그 쾌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며 웃었다.
무엇보다 두 배우의 입을 빌려 계속 언급되는 조명디자이너 '바티스트'의 존재가 눈길을 끈다. 연출가와 여배우의 가시 돋힌 대사들 사이에서 '무대'를 상징하는 바티스트는 두 배우의 속마음을 밝히고, 때로는 진정시켜준다. 내로라하는 조명디자이너 김철희가 바티스트의 역을 맡아 무대에 불을 밝히고 끈다.
라팽 연출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짚었다. "스태프 없이 공연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공연 스태프들이 데모를 많이 한다. 한국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보장을 못 받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바티스트 같은 스태프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최인훈 희곡연구로 파리 7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라팽 연출은 한국 관객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 "한국 배우들하고 하니, 작품 자체가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동하니 색깔이 변한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 유희적인 면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극단 프랑코포니의 임혜경 대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했다. 서울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김보경 교수가 번역했다. 30일까지 대학로 게릴라극장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