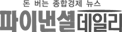백제시대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며 문헌 속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전남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의 '천년고성' 진원성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남쪽 성문 터인 남문지와 성벽의 발굴을 통해 진원성은 백제시대 처음 축조(초축)돼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까지 3차례 수·개축이 이뤄졌으며 당시 진원현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치소(治所)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고고학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는 만큼 유물 등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문화재연구원은 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진원성 옛터에서 '진원성 발굴조사 현장 학술 자문회의'를 열었다.
자문회의에는 김경칠 전남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과 전남도·장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심정보 한밭대학교 명예교수와 최인선 순천대 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부분은 진원성의 남문지(南門址)와 서벽·북벽이다.
진원성은 내외벽을 석재로 쌓아 올린 협축식으로, 조사단은 초축 이후 내외벽 모두 한 겹의 석축이 덧대어져 축조된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남문지는 크게 3차례 정도 수·개축이 이뤄졌다.
1차는 장방형의 할석을 수평으로 쌓았으며 개구부에서 곡선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순천 검단산성, 여수 고락산성 등 전남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백제산성의 성벽과 유사하다.
2차는 비교적 잘 다듬어진 사각축 형태의 돌을 수평으로 쌓았는데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성벽이며 3차는 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성 외벽은 1차 벽과 2차 벽으로 구분된다. 축조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백제시대 1차벽을 쌓은 뒤 이후 통일신라시대 2차 벽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칠 조사단장은 "일반적으로 앞 시대에 쌓은 성곽이 무너지거나 파손될 경우 이를 보강해 사용하는데 진원성은 1차 벽 앞에 성곽을 신축했다"며 "이는 매우 드문 형태이며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 외벽의 특징은 서벽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북벽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인선 순천대 교수는 "북벽에 1차 외벽이 없거나 축성법이 다른 점으로 미뤄 애초 400~700m 성벽 둘레로 지어진 진원성이 이후 어떤 이유로 인해 확대된 것이 아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정보 한밭대 명예교수는 "진원성은 백제시대 처음 축조돼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까지 이어진 산성인 것 같다"며 "시대적인 변천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재밌는 유적이다. 유물의 추가 발굴을 통해 2차 외벽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숙제"라고 말했다.
김경칠 조사단장은 "발굴된 유물에서 '관(官)'이라는 글자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구사진혜현'에서 8세기(758년) 진원현으로 개칭된 이후 진원성이 '치소'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치소'는 전통시대 고을(邑)과 연관된 개념으로, 관료가 거주하고 관청이 위치하는 등 일대를 다스리던 행정적 중심지를 의미하고 있다.
김 단장은 "진원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이번이 처음 이뤄진 것"이라며 "그 범위가 극히 일부분으로 향후 연차 발굴조사를 통해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원성은 백제 사비시대 때 축조(둘레 1.3㎞)된 천년고성이다. 정유재란 때 폐허가 되기 이전까지 진원현을 다스린 성으로 알려져 있다. 낮고 평평한 분지형의 두 봉우리 능선을 따라 설치된 포곡형(包谷形) 산성이다. 지난 1984년 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12호로 지정됐다.
현재 전남 장성군은 진원성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식 없이 지하에"…교황청, 유언장 공개[교황 선종]](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7/art_174530427798_24cd29_330x220_c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