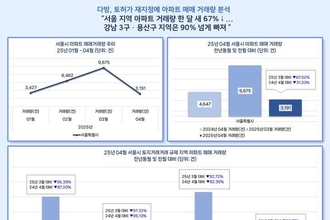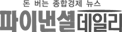진윤경(32)의 피리는 아득했고, 조혜령(32)의 해금은 애달팠다.
'국악계 디바'로 손꼽히는 두 동갑내기 연주자가 13일 밤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연달아 올랐다.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이 올해 야심 차게 선보이는 '금요공감' 시연회. 국악이 대중음악, 클래식, 재즈, 연극, 무용, 문학 등 타 장르와 협업으로 꾸며지는 공연이다.
진윤경과 조혜령은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 음악에도 품위가 있다는 걸 증명했다. 무조건 섞는다고 퓨전이 아니다. 국악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을 때 가능하다.
진윤경의 피리 연주는 실크로드로 데려갔다. 자신이 작곡한 '꽃잎이 춤추던 날'로 여행길의 문을 열었다. 기타가 끌고 양금(국악기 중 채로 뜯는 현악기)이 돕고 피리가 그 바람을 타고 날 채비를 했다.
고대에 구자라고 불렸던 쿠차로 떠나는 여행. '수서(隋書)' '당서(唐書)' '악학궤범(樂學軌範)' 등의 문헌에 "피리는 구자에서 생겼다"고 명시됐다.
'쿠차'를 비롯해 '투루판' '둔황' '카슈가르'가 울려 퍼진다. 여행 과정에서 거친 지역 이름을 따 노래 제목을 지었다. 현지에서 찍은 영상이 현실감을 더한다.
진윤경은 "쿠차에는 그러나 피리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피리가 불린다. 그녀는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눈을 반짝였다. 피리 소리는 내내 절제됐으면서도 울부짖었다.
조혜령의 진윤경의 피리 바람을 이어받아 해금을 튕겼다. 이날 그녀가 내세운 주제는 '해금, 춤을 만나다' '다랑쉬'(작곡 김대성)을 연주할 때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박상주가 제주 4·3항쟁의 넋을 달랬다. 다랑쉬는 제주도의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산 이름이다.
해금이 주가 돼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재즈 모음곡 2번에는 탭댄스가 곁들여졌다. 탭퍼제이 지은성이 그녀의 곁에 섰다. 해금은 아코디언,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서양 악기 사이에서도 꿋꿋이 '리드 악기' 역을 감당했다. 탭댄스는 리듬 악기였다.
조혜령은 "대중이 국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서양 악기랑 협업하면서 해금 소리가 잘 나갈까 두려웠는데 잘 들렸다. 이런 작업을 또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드문 좌식 공연장(규모 130석)인 풍류사랑방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자연 음향. 마이크로 왜곡되지 않고 악기 본연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이기도 한 진윤경과 조혜령의 피리와 해금 소리는 그래서 더 풍성했다. 귀엽고 예쁘장한 외모로 스타성도 겸비한 두 사람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바람이 매서운 겨울에 따듯한 온돌 위에 앉아 풍류를 즐기는 이 순간이야말로 호사였다. 진정한 풍류는 이런 것이다. 커튼콜 때 실연자를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건 덤이다.
국립국악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풍류사랑방에서 금요공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수요일에는 전통춤의 명인과 젊은 무용가가 함께 선보이는 '수요춤전', 목요일에는 장르별 국악 명인들이 꾸미는 고품격 실내악 공연 '목요풍류', 토요일 무대는 명사와 함께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들 공연 횟수를 모두 합치면 총 180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