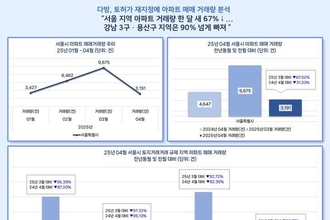‘선인장’과 ‘인물 시리즈’를 통해 객관적 대상에 주목해온 이광호(47)가 풍경, 그 중에서도 숲을 더듬었다.
그가 포착한 풍경은 인적 없는 제주도 곶자왈이다. 그곳의 낮 풍경과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축축한 느낌의 덤불, 어스름 빛이 내린 새벽녘의 숲 등을 화폭에 옮겼다. 화면 속 숲은 앙상한 가지들이 드러난 겨울 모습이다.
그가 숲에 주목한 이유는 특별하지 않다.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숲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된다”는 그는 “선인장 같은 경우는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객관적 대상에 주관적 해석을 가미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나 숲은 막막하고 무한한 정도가 선인장이나 인물보다 훨씬 더 광활해 화가로서 도전의 폭도 무한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겨울 숲을 그린 것은 숲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는 “여름에는 가지에 잎이 돋아 덩어리가 된다. 즉, 나무의 구조 자체가 가려진다. 그러나 겨울에는 그런 구조들이 모두 드러나므로 그리기에 더 흥미롭다”고 밝혔다.
화폭에 담긴 숲은 같은 장소를 시간의 변화에 맞춰 10여 번 이상을 찾으며 관찰한 결과물이다. “같은 장소지만, 찾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그는 “날씨에 따라, 나의 그 날 심리상태에 따라 색다른 모습을 뿜어내는 숲에 매료됐다”고 했다.
그는 일정 시간을 두고 같은 곳을 찾게 되면서 전에 기억했던 숲과 달라진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썩어가거나 사라진 나무들…, 그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도 붙였다.
그는 낮보다도 밤 풍경에 더 애착을 느낀듯했다. 그는 “밤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밤에 숲을 관찰했는데 보이는 게 없었다. 보이지 않으니 다른 감각이 작동했다. 온도, 소리, 냄새 등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다. 무모한 도전이었다”며 “심리적으로도 두렵고 공포감도 느껴 오래 있질 못했다”고 엄살을 떨기도 했다.
밤의 숲은 자신과 대면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런 느낌을 밤 풍경으로 풀어냈다”고 덧붙였다.
밤 풍경은 숲 속에서 헤매듯이, 더듬거리면서 그렸다고 했다. 그는 “밤 풍경은 완벽하게 구상하고 그리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들어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되면서 점점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면서 “작품이 끝날 때쯤 ‘아, 내가 이런 것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광호가 촉각적이고 심상적인 풍경을 탐구한 작품 21점을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16일부터 소개한다. 그가 풍경으로 들어가 뒤엉킨 넝쿨과 잔가지 속에서 구획된 대상이 아닌 겨울 숲 풍경 자체의 분위기를 풀어낸 작품들이다. 속도감 있는 붓질과 중첩된 터치, 부드럽게 뭉개지거나 날카롭게 긁어낸 윤곽선 등은 곶자왈의 겨울 풍경 맛을 더한다.
전시는 ‘그림풍경’이란 제목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열린다. 02-735-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