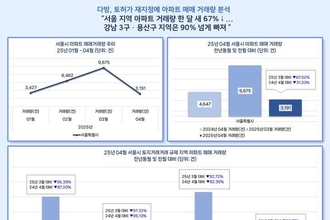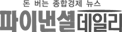이정연 삼성디자인학교(SADI) 교수(동양화 전공·미국 첼시 킵스갤러리 전속작가)가 11월1일부터 한 달 간 이탈리아 팔라조 타글리아페로 뮤지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신창세기'를 주제로 옻칠과 자개 등을 이용한 30~100호 작품 70여점을 선보인다. 삼베, 옻, 흙, 금, 자개 등 한국 전통의 자연재료를 사용해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세계관을 화폭에 구현한다.
이정연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의 형식은 매체만큼 다양한 실험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삼베 위에 옻칠을 덧입힌 건칠기법을 도입한 회화작업을 했다.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생명체를 그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나무다.
상징적인 언어인 대나무는 나팔 또는 대롱과 같은 모양으로 변주된다. 주로 '통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나와 타인, 안과 밖, 나와 영원한 우주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관계의 성립, 만남의 상징적 역할을 한다. 소통의 수단이다.
이 나팔모양과 같은 대나무 통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은밀한 웜홀이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서 미지와 조우하는 통로로서의 관은 시공간을 뛰어 넘는다. 그녀의 대나무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듣는 도구다. 초월적 세계와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구실을 한다.
이 웜홀은 모든 메시지를 블랙홀처럼 받아들이고 새로운 우주가 돼 빅뱅하는 화이트홀로 탄생한다. 수많은 각도로 뻗은 여러 형태의 나팔들은 다양한 해석의 관점이며 소통의 방식이 된다.
신을 향한 자신의 삶과 열정, 그 위에 예술적 표현을 더한 기도, 사랑과 에너지가 작품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세상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고 영원에 도달하려는 끊임 없는 기도와 자기 성찰,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강한 구애, 생명에 대한 감사와 시가 곧 이정연의 작품이다.
악기가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속이 비어 있어야 하듯 서로가 겸손히 자신을 내려 놓고 텅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한다. 대나무는 속이 비었다. 자신을 비운 낮은 자의 모습이다. 중심이 비어야 남의 소리를 잘 듣고 소통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야 주변을 더 많이 배려하게 된다.
붓이나 나이프 같은 화구는 간접적인 표현도구일 수 있다. 작가는 손끝에 의한 표현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을 택한다.
이정연 교수는 지난 1월 일본 도쿄 왕립 우에노 모리 미술관에서 '소통'을 주제로 135점(300호 이상 35점)의 작품들로 개인전을 열었다. 우에노 모리 미술관은 1879년 설립된 일본 최고의 미술가 단체인 일본미술협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1972년 설립됐다. 일왕의 막내딸이 재단 이사장이어서 전시 초대작 선정에 다소 배타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이 미술관 1, 2층 전관에서 전시회를 연 최초의 한국인이 바로 이 교수다.
현지 평론가 와시오 토요히코는 "만약 자연과 인간사회를 처음 창조한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신자인 그녀는 그 자연과 인간사회, 더욱 다가서서 말한다면, 현실의 자연 그 자체와 한민족이 일상적으로 애착하는 조형물을 자기 나름대로 재생해 그것을 회화작품으로 지지체의 평면상에 배치했다"면서 "이정연의 타블로는 한반도의 풍토와 민족성을 상기시킨다. 특히 많이 사용한 조개의 상감은 조선왕조나 양반계급의 문화적 전통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놀랄 차례다. 이정연과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