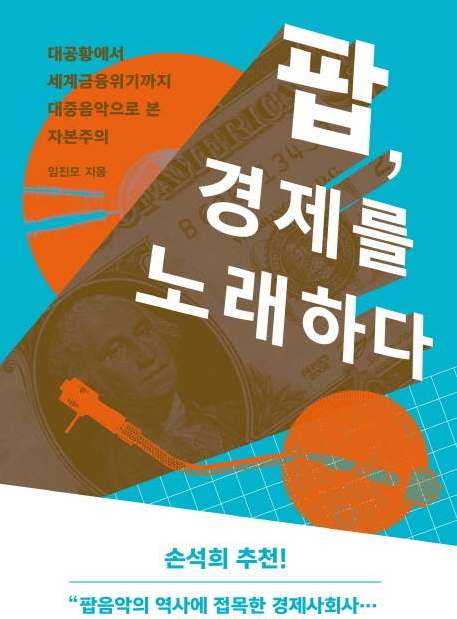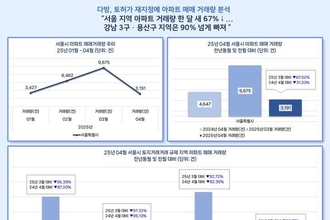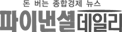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의 초기 히트곡 중에 '머니(Money)(댓츠 왓 아이 원트(that's what I want))'라는 곡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라는 뜻의 이 노래 가사는 노골적이기 짝이 없다. "돈이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라고 노래한다.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55)에 따르면 리버풀의 찢어지게 가난한 노동계급 후손인 비틀스 멤버들은 10%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저생산성, 잦은 노사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던 영국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도 없고 군대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 성공하는 길은 음악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곧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Can't Buy Me Love)라는 곡도 부르지만 애초에는 돈을 벌어 가난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에 불탔다. 임진모는 그래서 "결국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 영국의 경기침체와 징병제 해체가 비틀스를 낳은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짚는다.
임진모가 새로 펴낸 책 '팝, 경제를 노래하다'는 1930년대 경제공황기부터 2000년대 세계금융위기까지 경제사를 대중음악을 통해 훑어 내려간다.
음악평론가를 꿈꾸던 고등학생 시절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듣고 충격에 빠졌던 경험으로 책의 서두를 연다. 멜로디 전개와 연주에만 매혹돼 있던 그는 해외 시사주간에서 '이 곡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실이라는 주제의식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대표되는 미국의 뒤안길을 쓰라리게 해부한 노래'라는 평을 읽고는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음악 비평에 '정치와 경제를 포괄한 사회성'이라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음악의 메시지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다.
예컨대 1960년대 미국의 풍요로웠던 서부 캘리포니아와 서핑 뮤직의 상관 관계가 그렇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됐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넓은 고용 기회 덕분이었다.
임진모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과 낙관, 나아가 쾌락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정서를 지배했다"면서 "이곳의 음악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서핑 뮤직이었다"고 짚는다.
"이는 동부 지역에서 유행한 밥 딜런과 조앤 바에즈의 포크 음악과는 양상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면서 "이때 대표성을 획득한 서부의 그룹이 바로 비치 보이스다. 요즘도 여름만 되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서핑하는 미국'(Surfin' USA)은 단연코 이 시대 캘리포니아의 주제곡"이라고 설명한다.
간간히 등장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 대중음악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오일 쇼크가 강타한 1970년대, 특히 원유가 전혀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온통 석유 타령이었고 산유국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때 이런 현실을 반영한 노래가 정난이의 '제7광구'였다는 정보는 번뜩인다. 아울러 IMF 체제 시절 그때까지의 가요계 흐름과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던 크라잉넛, 노브레인 등 펑크 록이 유행한 사실도 짚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