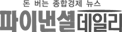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다음 달 1일 미국 상호관세 조치 발효 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타결한 사례를 감안하면, 협상의 돌파구는 한국이 제시할 대미 투자 규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 소재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는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30%의 상호관세보다는 절반이나 완화된 수준이다.
다만 EU는 그 대가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7500억 달러 구매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6000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대규모 군수 물자도 구매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역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
대신 일본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 미국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5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이 요구하던 농산물·자동차 시장 개방도 양보했다.
미국의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미일 조인트벤처(JV) 설립 등도 무역합의에 담겼다.
주요국의 무역합의 사례를 고려하면, 관건은 한국의 투자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느냐다.
외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1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제시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간 격차가 큰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한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한·미 관세 회담 결과에 대해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쪽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의 수요가 큰 조선업 재건을 위한 기업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정책금융·보증을 통해 총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한화오션, HD현대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 계속 확장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협상 카드로 끄집어내야 된다"며 "기업의 직접투자와 정부의 간접지원을 다 포함해서 전체 규모를 크게 키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