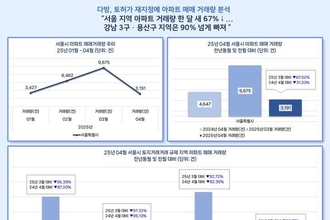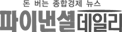인문학 저술가 정지우는 '분노사회'를 통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본 적 없는 분노에 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한다. 우리 속에 가득하지만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분노라는 감정으로부터 출발해 한국사회에 접근한다. 사회와 연계한 감정은 자연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사회라는 관념에 상응하는 감정이다. 분노는 기쁨, 슬픔, 두려움, 당혹감 등 다른 감정들과 달리 관념에서 촉발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원래 분노란 생존과 자기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감정이지만, 현대인은 더 이상 생존과는 거의 관련 없는 방식으로 분노를 생산한다. 분노가 발생하는 조건이란, 자신이 가진 관념이 현실과 어긋날 때 혹은 자기 내부에서 관념이 이미 어긋나 있을 때다. 이러한 불일치는 인간에게 부적절감을 만들어내며, 이 어긋남과 부적절감이야말로 분노의 원천이다. 분노에 관한 이러한 명확한 개념 규정은 이후 분노사회의 문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로 제시된다.
나아가 정지우는 게일린의 '증오' 개념을 통해 분노가 증오로 발전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한다. 특히 여기에서 저자는 집단 정체성과 시기심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사회의 분노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준거 틀이 된다.
한병철 교수(베를린예술대)의 '피로사회'는 철학적 관점에서 독일 사회를 '피로'로 진단한 독창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사회'라는 이름을 붙인 많은 책이 나왔지만, 한병철이 독일 사회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것처럼 한국 사회를 하나의 철학적 테마로 분석한 경우는 보기 드물었다. 정지우는 한국 사회의 핵심적 면모를 '피로'가 아닌 '분노'로 파악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과 그 속의 인간상을 풀어냈다.
그는 분노가 관념에서 촉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사회의 가장 문제있는 관념으로 '집단주의'를 꼽는다.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권의 유산으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집단주의는 갈등과 병폐, 분노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그에 대항하며 출현한 개인주의도 많은 경우 폐쇄적으로 퇴행해 새로운 증오 현상을 나타낸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진정한 개인주의가 사회에 정립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집단주의와 퇴행적 개인주의 사이에서 압사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