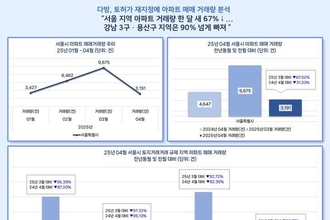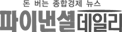안중근(1879년 9월2일~1910년 3월26일) 의사와 관련한 일본 아베 정부의 고위관료 등 우익성향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과 행동은 우리에게 분노와 경악을 넘어 처절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와중에 중국정부가 올해 초 하얼빈 역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개관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금년은 안 의사가 1910년 3월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한 지 105주년을 맞이한 해이기에 보다 냉철한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의 영웅인 안 의사를 숭모해 왔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안 의사가 남긴 최후의 유언인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 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 객사한 사람을 제 곳으로 옮겨 장사함)해 다오”라는 말씀을 언제 실천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우연히 서울 지하철 역에서 안 의사 관련 포스터가 눈에 띄어 그 내용을 보니, 묘지 사진과 함께 “다시 보는 역사 속 인물 안중근, 묘비도 비석도 없는 효창공원의 주인 없는 허묘(虛墓)를 아십니까?”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2009) 40쪽에 실린 사진 설명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환국 후 효창공원에 의사묘역을 설정하고 안 의사의 유해를 모시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분(假墳)만 만들고, 그 옆으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만을 봉안하였다’고 돼 있다.
본문에는 ‘유해는 두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의사의 유언대로 하얼빈 공원 곁에 묻을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안 의사의 유해가 밖으로 나갔을 때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안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뤼순감옥 죄수 묘지에 묻혀 있어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1980년대 이후 수차례 현지 답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묘지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언제까지 유해가 있는 곳을 찾는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고 갈 것인가. 만에 하나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 거의 소실됐을 것이다.
원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례 전통은 유해가 망실된 경우, 그 혼령을 모시는 설단(設壇) 또는 제단을 만들어 분묘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 곳에서 향제(享祭)도 지내고 추모행사도 하는 것이 상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안중근의사 설단 봉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을 실천하고 혼령을 위로하는 마땅한 도리이며 책무일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도 안 의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테러범으로 모는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망언자들은 이런 사실을 역이용해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의 유언을 무려 100년이 넘도록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말들이 많으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자들의 위패를 모아놓고 총리와 각료들이 수시로 참배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안 의사 최후의 유언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지사정상 거의 찾을 길이 안 보이는 유해 발굴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가 보훈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는 허송세월의 고백일는 지도 모른다.
무려 60여년 동안 효창공원 의사 묘역 한켠에 외롭게 있는 안 의사의 허묘(가묘)를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