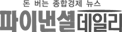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수소탄 실험을 하리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부터 해외 북한전문기관 등에서 인공사진을 근거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꾸준히 예고해 왔으나, 가장 유력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10월10일) 때 하지 않았다.
더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올 신년사에서도 핵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 내용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이미 첫 수소탄 실험을 지시해 놓고서는, 신년사에서 이를 짐작케 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과거 3차례 실험 때와 달리 사전에 주변국 등에 예고나 통보도 안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블러핑’에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 모두가 허를 찔린 셈이다.
김 제1비서는 올 신년사에서 ‘(경제과 핵) 병진노선’이나 ‘핵억제력’ 등 과거 신년사에서 단골로 등장했었던 말을 일절 하지 않았다. ‘핵억제력’은 핵무기를 표현하는 말로, 지난 해 신년사에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라고 했었다.
올해는 지난 해 10월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대해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 올린 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 당국자는 물론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핵실험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핵실험보다 더 큰 위력…’이란 말에 모두 속은 셈이다.
심지어 김 제1비서가 핵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라든가, 노동당 7차대회를 앞두고 경제에 매진하기 위한 것, 또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대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등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기도 했었다.
허를 찔린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엔 ‘김정은은 왜 그랬을까?’를 두고 분석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김 제1비서가 원래 ‘파격적이고 즉흥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랬을 것으로 보고있다. 7차 당대회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겐 ‘깜짝 선물’을 선사하고,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키려는 이벤트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은 평소 군부대 시찰 때에도 미리 준비한 것들은 무시하고 즉석에서 이것 저것을 시켜서 단위 부대들이 당황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 2013년 핵실험 이후 미국 측에 핵문제와 대미 평화협정을 맞바꿀 수 있다는 제안을 계속했으나, 미국이 아무런 대응없이 오히려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관리하려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된 상황에서 이런 충격 요법을 썼을 것이란 이야기다.
한 전문가는 “올해는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고 한국도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는 등 주변 국가들이 대내 정치일정으로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연초에 실험을 강행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제1비서의 의도가 무엇이든, 스타일이 어떻듯 이번 핵실험이 그 누구도 예상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제제 등으로 단호한 대응을 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추가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해 8월 군사분계선 지뢰도발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에도 막판에 협상을 요구해왔던 점에서, 이번에도 상황이 악화되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 제1비서로선 대내 선전과 핵보유국 인정 등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점에서 협상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8일 정오부터 재개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나 북핵문제가 극도의 긴장 끝에 늘 대화로 이어졌다는 관례가 이번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