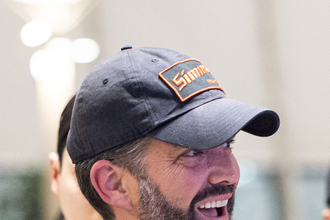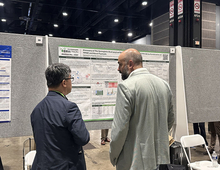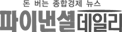남북한의 관계개선 등과 관련해 개성공단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는 남북한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에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 사업이다.
개성공단의 역사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0월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공단 건설에 합의했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2004년 12월에 정식 생산을 시작했다.
당초 현대아산은 1단계 3.3㎢, 2단계 8.3㎢, 3단계 18.2㎢ 및 개성시·확장구역 36.3㎢ 등 총 3단계에 걸쳐 66.1㎢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져 현재는 1단계 100만평 기반공사가 끝난 상태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의 중요한 요충지이자,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 생산 시작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개성공단에는 5만여명의 북한 근로자와 800여명의 남측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입주업체도 2005년 18개 업체로 시작해 이듬해 30개 업체, 2011년 123개 업체, 현재 124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누계 생산액은 10여년 만에 30억 달러(약 3조5490억원)를 돌파했다. 사업 첫해인 2005년에 비해 기업수는 7배, 북한 근로자는 9배, 한 해 생산액은 3배 넘게 성장했다.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 중단됐던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생산액은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 해 총 생산액이 5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북쪽은 개성공단을 통해 외화 3억754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남쪽에도 매출과 설비투자 등 32억6400만 달러의 직접적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 인건비 절감, 고용 유발 등 간접적 기대효과는 49억 달러로 추산됐다. 3단계 개발이 완료됐다면 직접적 경제효과는 북쪽 43억 달러, 남쪽 642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2009년 북한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남북 간에 냉전구도가 들어설 때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고, 남측은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2009년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 한명이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가 137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2013년 8월에는 남북한의 미묘한 문제로 134일 동안 개성공단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의 몫이었다. 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은 납품 연, 수주 불발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원·부자재를 포함한 모든 생산제품을 공단 현지에서 보관하고 있어 공단 폐쇄로 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긴장감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지만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입주기업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모습이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군사밀집지역에서 산업단지로 변화한 곳"이라며 "기술과 자본이 뛰어난 남측과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가진 북측이 협력하고 있는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협회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개성공단 활성화를 비롯해 제2개성공단 조성 등을 통해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