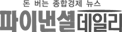개성공단이 폐쇄 직전에 몰리며 '제2의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 직전에 몰리며 '제2의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설과 사업권을 북한이 몰수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운영의 핵심인 전기 공급권을 우리 측이 갖고 있다.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 하지만 감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결국 개성공단의 운명은 북한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다.
당장 오늘(11일)부터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접촉이 이뤄지면서 철수에 따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북측은 남북합의에 따라 50년 동안 공단을 가동하기로 했지만, 남측이 일방적으로 철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합의위반으로 본다. 남은 39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5만4000여 명의 임금 등 연간 약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남측으로부터 받고 있다.
특히 남측이 전력공급을 중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공단 가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단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추가로 복구비용까지 요구할 경우 사실상 협상이 어려움을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 철수와 관련해서는 남측의 민심과 국제적인 인권문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개별 기업이 원한다면 대체 산업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을 접고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북한의 일방적 통행 제한 조치로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됐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대책이다. 이번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하거나 공단이 완전 폐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06년 1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에도 정상조업을 유지해 유일한 협력 창구가 돼왔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폐쇄를 발표한 뒤 남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하고 북한 근로자를 일방 철수시키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었다. 이후 134일 동안 공단은 문을 닫았고, 같은 해 9월에서야 가동이 재개됐다.
일각에서는 북한 측도 우리 측 압박의 카드로 설비를 몰수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의견도 나온다.
향후 남북의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개성공단 완제품과 반제품 반출도 업종별로 철수 일정을 조정해 반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북이 경직된 상태로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CES 본격 개막…전 세계인, LG·현대차 등 주목[CES 2026]](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7462705_a3bb74_330x220_c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