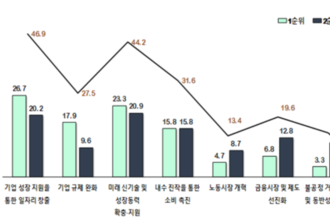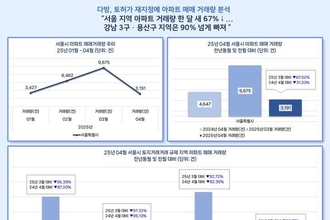단어 하나하나에서 위트가 넘친다. 유쾌하고 솔직한 배우 정재영(44)은 촬영장에서도 자연스레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하지만 영화 ‘방황하는 칼날’(감독 이정호)에서만큼은 예외였다.
‘방황하는 칼날’은 스릴러 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한순간 딸을 잃고 살인자가 돼버린 아버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이성민)의 추격기다.
정재영은 열여덟 살 청소년들에게 딸을 잃은 아빠 ‘상현’이 됐다. 죽기 전 입에 거품을 물고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영상을 보고 피의자들을 직접 벌하기로 한다. 황량한 강원도 대관령에서 무릎까지 쌓인 눈밭을 한없이 걸었다. 추위는 견딜 만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었던 영화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다. “육체적인 추위는 견딜 만했어요. 그보다 더 힘들었던 적도 많았고요”라고 털어놓았다. “고통이라는 건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라는 것이다.
‘딸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됐다. 세밀한 감정조절이 필요했다. “정확한 감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실제로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었죠. 연기한 후에도 찜찜하고 적절한 선이 아닌 것 같아 고통스러웠어요. 계속 감정을 느끼기 위해 현장에서도 우울하게 있어야만 했죠.”
“피해자의 고통을 아버지로서 공감해야 했다. 하지만 행동은 특별하다. 차라리 완벽한 허구라면 연기하기 더 쉬웠을 것 같다. 주위에 있는 아버지이고, 또 나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아팠다”는 고백이다.
“촬영장 밖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마음이 불편해 끊임없이 정신을 괴롭혔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와도 휴식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감정선을 깨뜨리는 방해물이었죠”는 말에서 힘겨웠던 시간이 느껴졌다.
“운동선수들은 근육을 쓰니 휴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저희는 정서를 가지고 일을 해서 한 번 감정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인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안 쉬는 게 유리할 때가 많아요. 다행히 강원도 촬영이 많아 혼자 숙소에 있을 수 있었어요. 또 술을 마셔도 한 작품의 스태프들이어서 ‘상현’의 감정이 남아 있었죠.”
자신을 괴롭히며 감정을 극대화했다. 철저히 상현이고자 싶었다. 하지만 “단 한 번 몰입이 깨진 적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배우로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청소년들에게 길을 물어보다가 오해를 받아 집단으로 구타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연기자가 아니다 보니 진짜로 때리는 거예요. 온몸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보호대가 없는 정강이 같은 곳을 계속 찼어요. 감독님은 커트를 안 하고.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화를 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라며 크게 웃었다. “아직 남아있나?”라며 바지를 걷어 올렸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건만 아직도 다리에는 검은 흉터가 남아 있다. “그때는 팅팅 붓고 색깔까지 죽었다.”
정재영은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후 “딸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 딸이 있는 이성민(46)은 “같은 상황에 놓이면 상현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재영은 “남의 일처럼 느끼려고 했다”며 감정을 다잡았다.
“제가 딸이 있으면 연관이 되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딸을, 내 연기를 위해서 ‘살해당했다’는 생각을 몇 개월 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만약 딸이 다치기라도 하면 죄책감까지 들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정재영은 진통 중이다. ‘방황하는 칼날’의 부담을 덜어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