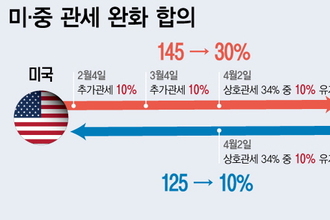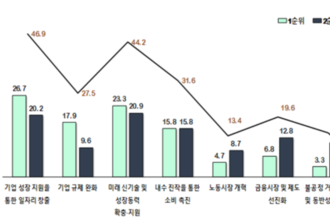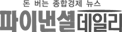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감독 이석훈)의 성공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군도: 민란의 시대’(감독 윤종빈)와 ‘명량’(감독 김한민) 사이에 끼어 있는 대진표가 불안해 보였고, 윤종빈과 김한민이라는 걸출한 감독의 이름값에 비해 이석훈 감독의 무게감도 덜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도’가 내세운 하정우와 강동원라는, 영화계를 짊어질 두 젊은 배우와 ‘명량’이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카드인 최민식에 비하면 ‘해적’의 두 주인공 손예진과 김남길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패가 아니었다.
하지만 ‘해적’은 해냈다. ‘명량’의 거대한 성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순신 신드롬을 버텨내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해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슷하다. ‘영화의 완성도는 떨어지나 웃기다’ 혹은 ‘웃기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해낸다’. 그러니까 웃기는 영화라는 것, 그것이 ‘해적’의 성공을 가능케 했다.
이석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댄싱 퀸’(2012)이나 ‘두 얼굴의 여친’(2007) 등을 보면 이 감독이 유머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웃음을 주는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연출가로 보기는 힘들다. ‘해적’도 비슷한 경우인데,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는 않지만 유머가 유치하고 진부한 편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적’은 관객을 웃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웃겼기에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일까.
영화의 성공을 단순화 하는 것은 그리 의미있는 일은 아니나 ‘해적’의 경우에는 합당할는지 모른다. ‘해적’의 성공 지분 8할은 영화배우 유해진(44)이 쥐고 있다. 더 과장되게 말하면, 그는 정말 혼자 해냈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 아닌 ‘유해진: 산으로 간 해적’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다.
유해진이 연기한 ‘철봉’은 해적 출신 산적이다. 해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뱃멀미를 견디지 못하고 산적으로 이직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점이다. 코미디에서 흔히 쓰여 유효하지 않아 보이는 이 코드가 유해진을 통하면 관객을 곧바로 웃길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유해진이 예의 그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생선 비린내가 정말 싫다고 말할 때 관객은 웃지 않을 재간이 없다. 흔한 유머도 유해진 특유의 억양과 표정이 결합하면 기상천외한 코미디가 된다. 바다가 얼마나 넓은 곳인지, 고래가 얼마나 큰 동물인지 설명하는 장면은 대사만 놓고 보면 유머 감각을 느낄 수 없지만, 그것이 유해진의 리듬감과 결합하면 가장 재밌는 장면이 되는 식이다. 놀라운 능력이다.
유해진의 코미디 연기는 신기한 면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재밌는 것이라도 반복되면 질리게 마련이지만 유해진의 코미디 연기는 도무지 물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우치’(2009) ‘이장과 군수’(2007) ‘타짜’(2006) ‘왕의 남자’(2005) 등에서 그는 ‘해적’과 비슷한 톤의 코미디 연기를 했다.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횡설수설하듯 눙치는 방식인데, ‘공공의 적’에서 그랬고 ‘왕의 남자’에서도 그랬으며 ‘타짜’에서도 그렇게 연기했다. 비슷해 보이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캐릭터에 따라서 훈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냉기를 주입하기도 하는 그의 능력 때문이다. ‘공공의 적’에서는 양아치스러움, ‘타짜’에서는 따뜻함, ‘전우치’에서는 귀여움을 유머와 섞는다.
유해진의 코미디가 유효한 것은 그가 적절한 시기에 연기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간첩’(2012)이나 ‘부당거래’(2010) ‘이끼’(2010) 등에서 보여준 눈빛의 서늘함은 엉뚱한 소리로 사람을 웃기던 그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날이 서 있다.
어떤 역할을 맡아도 발성이 좋고, 발음이 정확하다는 것도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다.
유해진은 최근 개봉을 앞둔 ‘타짜: 신의 손’(감독 강형철) 간담회에서 “‘해적’의 철봉처럼 무작정 웃기려고만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전작 ‘타짜’의 ‘고광렬’을 이어서 연기한다. 유해진의 ‘고광렬’ 연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나이 든 ‘고광렬’을 유해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대를 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