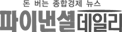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동차보험의 적자 구조 해결을 위해 대물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연구원은 12일 "보험금 누수를 유발할 수 있는 대물배상 보상제도의 느슨한 제도 운영이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6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물배상 보상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은 70~80%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보험산업의 적자는 무려 1조100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기 연구원은 "보험사 간 가격인하 경쟁과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에 모럴헤저드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큰 폭 늘어난 대물사고가 자동차 보험의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인 사고에 비해 보험금 배상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대물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난데다 외제차와 고가차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기 연구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의 수리비, 견인비, 렌트비 등을 보상원리에 부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실제 들어간 수리비용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예상 수리비를 추정해 보험금을 주는 현재의 추정 수리비제도가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대인사고는 이해관계자가 피해자와 병원 둘뿐이지만, 대물사고는 피해자 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부품·견인 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보험금을 둘러싼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 연구원은 "추정수리비를 받고도 피해자가 실제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추정수리비 지급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또, 보험금 보험금 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해 불필요한 수리를 막고 명확한 정비작업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정비요금 고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견인비의 측면에서는 피해자와 보험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견인이 이뤄지거나 견인업체와 수리업체 간의 짬짜미가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처럼 견인 조건과 견인비 관련 비용을 명시하고 견인시에는 피해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 연구원은 "보험요율과 상품 개발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지고 보상원리에 부합한 보상제도가 도입되면 손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